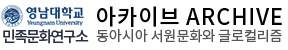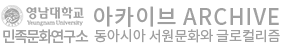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
지역
-
가평군
-
강남구
-
강동구
- 강릉시
-
강북구
-
강서구
-
강서구
- 강진군
-
강화군
-
거제시
- 거창군
- 경산시
-
경주시
-
계룡시
-
계양구
-
고령군
-
고성군
-
고성군
-
고양시
- 고창군
- 고흥군
- 곡성군
- 공주시
-
과천시
-
관악구
-
광명시
-
광산구
-
광양시
-
광주시
-
광진구
-
괴산군
- 구례군
-
구로구
-
구리시
- 구미시
-
군산시
- 군위군
-
군포시
- 금산군
-
금정구
-
금천구
-
기장군
- 김제시
- 김천시
-
김포시
- 김해시
- 나주시
- 남구
-
남구
-
남구
-
남구
-
남동구
-
남양주시
- 남원시
- 남해군
-
노원구
- 논산시
-
단양군
-
달서구
- 달성군
- 담양군
-
당진시
- 대구광역시
-
대덕구
-
도봉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대문구
-
동두천시
- 동래구
-
동작구
- 동해시
-
마포구
-
목포시
- 무안군
- 무주군
- 문경시
-
미추홀구
- 밀양시
- 보령시
- 보성군
-
보은군
- 봉화군
-
부산진구
-
부안군
- 부여군
-
부천시
-
부평구
-
북구
-
북구
-
북구
-
북구
-
사상구
- 사천시
-
사하구
- 산청군
- 삼척시
- 상주시
-
서구
- 서구
-
서구
-
서구
-
서대문구
- 서산시
- 서천군
-
서초구
-
성남시
-
성동구
-
성북구
- 성주군
- 세종시
-
속초시
-
송파구
-
수구
- 수성구
-
수영구
-
수원시
-
순창군
- 순천시
-
시흥시
-
신안군
-
아산시
- 안동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구군
- 양산시
-
양양군
-
양주시
-
양천구
-
양평군
- 여수시
-
여주시
-
연수구
-
연제구
-
연천군
- 영광군
- 영덕군
-
영도구
-
영동군
-
영등포구
- 영암군
-
영양군
- 영월군
- 영주시
- 영천시
-
예산군
-
예천군
- 예천군
-
오산시
-
옥천군
-
옹진군
-
완도군
-
완주군
-
용산구
-
용인시
-
울릉군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울진군
- 원주시
- 유성구
-
은평구
-
음성군
- 의령군
- 의성군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익산시
-
인제군
- 임실군
- 장성군
- 장수군
- 장흥군
- 전주시
-
정선군
- 정읍시
- 제주시
-
제천시
-
조치원읍
-
종로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랑구
-
증평군
-
진도군
- 진안군
- 진주시
-
진천군
- 창녕군
- 창원시
-
천안시
-
철원군
- 청도군
-
청송군
-
청양군
-
청주시
-
춘천시
-
충주시
- 칠곡군
-
칠곡군
-
태백시
-
태안군
- 통영시
-
파주시
-
평창군
-
평택시
-
포천시
- 포항시
-
하남시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함평군
- 합천군
- 해남군
- 해운대구
-
홍성군
- 홍천군
-
화성시
- 화순군
-
화천군
-
횡성군
-
가평군
- 건립시기
- 자료
간략정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전남 나주시 미천서원길 14-22 (안창동) |
| 건립연도 | 1690 |
| 문화재 지정 표기 | |
| 제향인 | 허목, 채제공 |
| 기타 | 서원 |
관찬사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 20년(1883) 10월 24일 신미
○ 방외 유생 진사 윤희배(尹喜培)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도(道)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으니, 사람은 잠시도 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곡진하게 가르쳐 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타고난 성품을 극진히 할 수 있는 자가 나온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를 명하여 스승을 삼고 교화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그 도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에 이제 삼왕(二帝三王)이 이 도를 가지고 서로 전했고 중도(中道)를 잡아 법칙(法則)을 세워 천하를 교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자(夫子)와 같은 분은 백성이 있은 이래로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직 없었으나, 낮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도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성(千聖)의 으뜸이 되고 만세(萬世)의 스승이 된 것은 천지에 세워도 부끄러움이 없고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자(顏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로부터 염계주씨(濂溪周氏 주돈이(周敦頤)), 횡거장씨(橫渠張氏 장재(張載)), 하남양정(河南兩程 정호(程顥)ㆍ정이(程頤) 형제), 고정 주 부자(考亭朱夫子 주희(朱熹))에 이르기까지 도통(道統)을 전한 것이 유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에 이르러서는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위로 주자의 통서(統緖)를 계승했고, 문목공(文穆公) 정구(鄭逑)가 직접 문순공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문목공의 문하에서 적전(嫡傳)을 얻은 자는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허목(許穆)이 바로 이분입니다.
허목은 남다른 자질을 타고났으니 헌걸차고 키가 컸으며, 이마는 오목하고 눈썹은 길어 눈을 덮었으며, 손바닥에는 ‘문(文)’ 자 무늬가 있었고 발바닥에는 ‘정(井)’ 자 무늬가 있었으며, 기상은 담담하고 화평하였고 용모는 이미 뭇사람 중에서 뛰어났습니다. 외부(外傅)에게 나아가 배우게 되어서는, 글을 읽는데 백 번을 읽지 않으면 외우지 못했으나 겨우 1권을 마치게 되자 글 뜻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옛사람의 말과 선현의 덕행을 듣기를 좋아했고, 이미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어 종형(從兄)인 징사(徵士) 장령 허후(許厚)를 좇아 학문하는 방법을 강론하였습니다. 장성해서는 문목공 정구에게 가서 스승으로 모시고 마침내 대유(大儒)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자경잠(自警箴)’ 4편을 지었는데, 첫 번째 수(首)에, ‘자신의 잇속만 차리는 자는 남을 속이는 것이지만, 하늘의 이치에 밝게 드러나 있어서 남을 속일 수는 없고 한갓 자신을 속일 뿐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성실하려면 반드시 자신에게 속임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 수에, ‘한 번 움직이는 데에도 부모를 감히 잊지 못하니,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여 허물을 부르지 말고 위험한 곳에 몸을 두어 위태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세 번째 수에,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여 허물을 경계할지어다. 엄숙하고 공경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섬길지어다.’라고 하였고, 네 번째 수에, ‘마음이 맡은 것은 생각이니 또한 행동에도 구사(九思)가 있도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게 되나니, 엄숙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모두 생각하지 않은 탓이다.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정당하게 죽는 것을 옛사람은 힘썼다.’ 하였습니다. 또 ‘십육계(十六戒)’가 있으니, ‘행언(行言)ㆍ희학(戲謔)ㆍ성색(聲色)ㆍ화리(貨利)ㆍ분치(忿疐)ㆍ교격(驕激)ㆍ첨녕(諂佞)ㆍ구사(苟私)ㆍ긍벌(矜伐)ㆍ기극(忌克)ㆍ치과(恥過)ㆍ택비(澤非)ㆍ논인(論人)ㆍ자후(訿詬)ㆍ행직(倖直)ㆍ경알(傾訐)이 그것인데, 이는 남의 선(善)을 없애고 허물을 드날리는 것이니, 시휘(時諱)와 세변(世變)에 대해 삼가지 않으면 작게는 꾸지람이 생기고 크게는 재앙이 자기 몸에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또 ‘희로지계(喜怒之戒)’에, ‘망녕되게 기뻐하면 부끄러움이 따르고 망녕되게 성을 내면 꾸짖음이 따르니, 삼가고 경계하여 반드시 공경할지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평소의 뜻을 세우고 실천하는 대개(大槪)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산 마을에 살면서 알려지거나 영달을 구하지 않았는데, 효종(孝宗) 원년(1650)에 상신(相臣) 원두표(元斗杓)가 천거하기를, ‘학문이 넓고 문장이 능하며 뜻이 고상하다.’고 하여, 정릉 참봉(靖陵參奉)에 제수되자 숙명(肅命)하고 돌아갔습니다. 8년에 효종이 산림(山林)의 인물을 등용할 것을 생각하여 다시 지평에 제수하는 소명(召命)이 있자 사직소를 올려 군덕(君德)과 시정(時政)을 아울러 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답에, ‘상소의 내용이 나라를 염려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아닌 것이 없다.’ 하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윽고 장령(掌令)에 제배하자 상소하기를, ‘천도(天道)는 강한 것을 숭상하고 일월(日月)은 밝은 것을 숭상하니, 임금의 도는 하늘을 본받아 세상을 다스려 통치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옥궤명(玉几銘)’을 올려 이르기를, ‘임금은 원수(元首)이니 백성의 부모가 됩니다. 자잘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덕이 있는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허물이 없도록 경계하여 덕과 의를 행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종 원년(1660)에 명을 받고 경연에 입시하여 《중용(中庸)》의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의 거취(去就)에 대해 강론하니,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이 나아가 아뢰기를, ‘허목은 독서인(讀書人)입니다. 말한 것이 매우 옳으니, 유의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 사람은 매양 귀향을 결행하고자 하니, 성심으로 힘써 유시하소서.’ 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대학연의(大學衍義)》의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뜻에 대하여 강론하기를, ‘심(心)과 물(物)은 서로 감통(感通)하는 이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미처 마치기도 전에 상이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의 학문에 대해 묻자, 대답하기를, ‘상산은 상달천리(上達天理)를 전적으로 주장하고 하학인사(下學人事)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異端)에 들어갔습니다. 비단 상산뿐만이 아니라 후세의 실제가 없는 학문이 모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적에 한결같이 인사(人事)를 우선하였기 때문에 공자의 문하에서 성(性)과 천도(天道)를 얻어 들은 자는 오직 안자(顏子)와 자공(子貢) 등 몇 사람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숙종(肅宗) 원년(1675)에 대사헌으로 소명(召命)을 받고 ‘심학도(心學圖)’ 및 ‘요순전수심법도(堯舜傳授心法圖)’를 올려 성학(聖學)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고문(古文)으로 ‘고요모(皐陶謨)’를 베껴 올리고 아뢰기를, ‘요(堯)ㆍ순(舜)ㆍ우(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