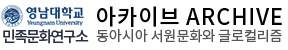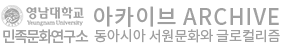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
지역
-
가평군
-
강남구
-
강동구
- 강릉시
-
강북구
-
강서구
-
강서구
- 강진군
-
강화군
-
거제시
- 거창군
- 경산시
-
경주시
-
계룡시
-
계양구
-
고령군
-
고성군
-
고성군
-
고양시
- 고창군
- 고흥군
- 곡성군
- 공주시
-
과천시
-
관악구
-
광명시
-
광산구
-
광양시
-
광주시
-
광진구
-
괴산군
- 구례군
-
구로구
-
구리시
- 구미시
-
군산시
- 군위군
-
군포시
- 금산군
-
금정구
-
금천구
-
기장군
- 김제시
- 김천시
-
김포시
- 김해시
- 나주시
- 남구
-
남구
-
남구
-
남구
-
남동구
-
남양주시
- 남원시
- 남해군
-
노원구
- 논산시
-
단양군
-
달서구
- 달성군
- 담양군
-
당진시
- 대구광역시
-
대덕구
-
도봉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대문구
-
동두천시
- 동래구
-
동작구
- 동해시
-
마포구
-
목포시
- 무안군
- 무주군
- 문경시
-
미추홀구
- 밀양시
- 보령시
- 보성군
-
보은군
- 봉화군
-
부산진구
-
부안군
- 부여군
-
부천시
-
부평구
-
북구
-
북구
-
북구
-
북구
-
사상구
- 사천시
-
사하구
- 산청군
- 삼척시
- 상주시
-
서구
- 서구
-
서구
-
서구
-
서대문구
- 서산시
- 서천군
-
서초구
-
성남시
-
성동구
-
성북구
- 성주군
- 세종시
-
속초시
-
송파구
-
수구
- 수성구
-
수영구
-
수원시
-
순창군
- 순천시
-
시흥시
-
신안군
-
아산시
- 안동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구군
- 양산시
-
양양군
-
양주시
-
양천구
-
양평군
- 여수시
-
여주시
-
연수구
-
연제구
-
연천군
- 영광군
- 영덕군
-
영도구
-
영동군
-
영등포구
- 영암군
-
영양군
- 영월군
- 영주시
- 영천시
-
예산군
-
예천군
- 예천군
-
오산시
-
옥천군
-
옹진군
-
완도군
-
완주군
-
용산구
-
용인시
-
울릉군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울진군
- 원주시
- 유성구
-
은평구
-
음성군
- 의령군
- 의성군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익산시
-
인제군
- 임실군
- 장성군
- 장수군
- 장흥군
- 전주시
-
정선군
- 정읍시
- 제주시
-
제천시
-
조치원읍
-
종로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랑구
-
증평군
-
진도군
- 진안군
- 진주시
-
진천군
- 창녕군
- 창원시
-
천안시
-
철원군
- 청도군
-
청송군
-
청양군
-
청주시
-
춘천시
-
충주시
- 칠곡군
-
칠곡군
-
태백시
-
태안군
- 통영시
-
파주시
-
평창군
-
평택시
-
포천시
- 포항시
-
하남시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함평군
- 합천군
- 해남군
- 해운대구
-
홍성군
- 홍천군
-
화성시
- 화순군
-
화천군
-
횡성군
-
가평군
- 건립시기
- 자료
간략정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769외 2필 |
| 건립연도 | 1702 |
| 문화재 지정 표기 | |
| 제향인 | 송준길 |
| 기타 | 서원 |
관찬사료
承政院日記, 英祖 12年 丙辰(1736), 4月 4日
진사 이해로(李海老)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옛날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이 생겨나는 곳을 분명히 아니,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근본은 삿됨과 바름을 사라지게 하느냐 자라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상전(象傳)〉에서는 두 가지의 기미를 더욱 삼갔습니다. 바름은 양(陽)이고 삿됨은 음(陰)이어서 곤괘(坤卦)의 초육효(初六爻)가 변하여 복괘(復卦)가 되면 하나의 양효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성인께서는 장차 다스려질 조짐이라는 것을 아셨고, 건괘(乾卦)의 초구효(初九爻)가 변하여 구괘(姤卦)가 되면 하나의 음효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성인께서는 장차 어지러워질 조짐이라는 것을 아셨으니, 기미가 생겨날 때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음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양을 도와주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고 삿됨을 물리치는 것으로는 현자를 높이는 것보다 우선으로 여길 것이 없으니, 세도의 성쇠는 현자의 진퇴에 드러납니다. 옛날에 순우곤(淳于髡)이 ‘자사(子思)가 신하로 있었는데도 노(魯)나라가 침탈당한 것이 더욱 심하였다.’라고 비난하고 마침내 ‘현자는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자, 맹자가 꾸짖기를 ‘현자를 쓰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니, 어찌 침탈만 당할 뿐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침탈당하는 것이 나라의 다행은 아니지만 맹자도 오히려 침탈만 당하기도 어렵다고 여긴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성인과 현자는 천리가 있는 곳이자 인의가 나오는 곳입니다. 윗사람이 만약 그들을 높일 줄 모르거나 혹은 높이더라도 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 망하지 않고 침탈만 당하는 것은 또한 다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종(祖宗)으로부터 이래로 인의로 나라를 세워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300여 년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재화가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끝내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학을 높이고 현자를 예우하며 의리를 바로 세운 덕분입니다. 우리 숙종대왕에 이르러서는 성상의 학문이 고명하여 이전 세상에서 다스려지고 어지러웠던 이유를 깊이 살펴 현자를 높이고 덕을 숭상하는 예를 극진하게 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며, 만년에는 더욱 정밀하게 사리를 살피고 더욱더 세상을 걱정하셨습니다. 직접 화양서원(華陽書院)과 흥암서원(興巖書院)의 편액을 써서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과 문정공 송준길(宋浚吉)의 아름다운 도덕을 높이 기리고는 마침내 선비들이 나아갈 길을 바로잡고 사설(邪說)을 종식하고자 한다고 하교하셨고, 또 경종(景宗)께서 대리(代理)하던 초기에 밝은 유지를 내려 분명하고 바르게 처분하라는 뜻을 보이면서 ‘나의 뜻을 너는 따르고, 혹시라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아, 이는 백세 뒤의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군의 자손이 공경히 잘 받들어 감히 실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고(聖考)께서 남기신 백성들 중에 누가 감히 유교(遺敎)를 어겨 성상을 현혹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지금 영남 사람 이인지(李麟至) 등이 무릅쓰고 상소 하나를 올려 두 선정신을 무함한 것이 지극히 흉악하고 비참하였으니, 참으로 사문(斯文)을 어지럽히는 적이며 세도의 커다란 변괴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하께서 크게 용단하고 밝게 처분하여 엄정하고 절실한 내용의 윤음(綸音)을 내려 ‘몇 해 전의 처분이 해와 별처럼 환하다.’라고 하셨고, 또 ‘계술(繼述)하는 도리로 보아 의당 선왕의 뜻을 준행하여 사설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들은 반복해서 크게 외우면서 전하께서 현자를 높이고 도를 지키며 뜻을 계승하고 사업을 이어 나가려는 성대한 뜻을 볼 수 있었으니, 만약 전하께서 학문에 힘쓴 공부가 하늘에 떠 있는 해처럼 밝아서 음양과 사정(邪正)의 분기점을 잘 살피고 치란과 성쇠의 기미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셨다면 처분의 엄정함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신들은 우러러 흠앙하고 감탄하여 비록 죽더라도 또한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선왕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여전하고 밝은 성상께서 위에 계시는데도 이 무리들은 오히려 간특한 말을 거리낌 없이 감히 어전에 아뢰었습니다. 이는 전하께서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깊이 살피셔야 할 것이지만, 신들이 또한 어찌 그저 성상의 밝은 판단만을 믿은 채 바름을 돕고 삿됨을 물리치는 의리를 성상께 한 번 아뢰지 않고서, 선조께서 도를 숭상한 미덕을 받들고 전하께서 계승하려는 뜻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이인지의 상소를 보건대, 송시열이 주자(朱子)를 높이고 《춘추》를 밝힌 것을 빙자하여 추후에 예론을 끌어다 흉악한 무리가 화를 전가하는 모략을 펴는 데 이르렀고, 또 원수 같은 자의 근거 없는 말을 두루 뽑아 비방하는 수단으로 삼아 안팎으로 농단을 부리고 속마음을 꾸미고 숨겼습니다. 비록 자신은 교묘하게 현자를 무함하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신들이 보건대 스스로 간사한 태도를 드러낸 셈이며, 그 나머지 흉언과 패설에서 오직 추한 욕설만 일삼은 것은 더욱 더불어 변론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아아, 송시열은 덕이 높고 학문이 독실하며 기운이 강직하고 행동이 방정하며 정직하고 총명하며 대범하고 준걸한 데다가 일찌감치 성인의 도를 들어 의리의 은미함을 몸소 탐구하여 ‘성현의 학문은 주자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으니, 성현을 배우고자 한다면 마땅히 주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은 줄곧 주자를 조종(祖宗)으로 삼아 해와 달을 보듯 도를 높이고 신명을 모시듯 글을 받들었으며, 주자의 도를 어기는 자를 보거든 난신적자를 다스리듯 하여 조금도 너그러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역적 윤휴(尹鑴)가 주자의 전주(箋註)를 함부로 고치고 여러 현자의 의론을 힘껏 배격할 적에 당시의 학사와 대부들이 대부분 중독되어 주자의 도가 거의 끊길 뻔했는데, 송시열이 이에 있는 힘껏 윤휴를 배척하여 마침내 몸소 도에 목숨을 바치고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윤휴의 설이 이 때문에 비록 당시에 널리 퍼지지는 못했지만 그 정신과 심술(心術)이 은밀하고도 몰래 전수된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니, 50년 동안에 국가의 화란이 매우 많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은 실로 주자를 배반한 데 있습니다. 지난날 송시열이 없었다면 또 어찌 화란이 이 정도에서 그치고 말 줄 장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송시열은 주자를 높이고 사설을 배척한 자이니, 국가와 세도에 보탬이 된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인지가 도리어 송시열이 가면을 썼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주자를 배반한 자들이 하던 짓인데 오히려 감히 주자를 직접 비난하지 못하고 주자를 높이는 송시열에게 칼날을 옮겼으니, 간악한 자의 속내가 남김없이 탄로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아, 송시열은 명(明)나라가 망하고 청(淸)나라가 세워진 뒤로 초야에 은둔하여 다시는 출사할 뜻이 없었습니다. 효종(孝宗)께서 재위하시어 분연히 설욕할 큰 뜻을 가졌으나 뭇 신하들 가운데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송시열이 옛 스승이었고 평소에 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고 판서 김익희(金益熙)에게 유시하여 송시열에게 은밀히 성상의 뜻을 전하여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을 책무를 맡기게 하자, 송시열이 은혜에 감격하여 즉각 부름에 나아갔습니다. 효종께서는 뜻을 합하여 큰 계책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므로 편전에서 밤중에도 독대를 하고 동궁에서 직접 수찰(手札)을 건네기도 한 것이 모두 지극한 정성에서 비롯하였으니, 장차 천하에 대의를 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효종께서 도중에 붕어(崩御)하시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는 충신과 지사들이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망과 의열은 세상을 지탱하고 기강을 세웠습니다. 옛날 제(齊)나라의 소백(小白)이 남쪽으로 초(楚)나라를 정벌할 적에 주(周)나라 왕실을 높인 것을 《춘추》에서 의롭게 여겼는데 소백은 본래 주나라의 내부에 봉해진 제후였고, 제갈량(諸葛亮)이 북쪽으로 조비(曹丕)를 정벌할 적에 한(漢)나라 왕업을 회복하고자 한 것을 《자치통감강목》에서 훌륭하게 여겼는데 제갈량은 본래 한나라 왕실의 대신이었습니다. 대저 외부에 봉해진 제후국으로서 천자를 위해 원수를 갚고자 하고 외부에 봉해진 제후국의 배신(陪臣)으로서 임금을 위해 천자의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은 예로부터 찾아봐도 오직 우리 효종과 송시열에게서만 보입니다. 이런 까닭에 효종 때에 보통의 사람들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병기를 들고서 오랑캐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하였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늘의 뜻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원수를 갚으려는 의리는 진정으로 지극한 정성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왔으니, 비록 북쪽으로 중원(中原)을 정벌하여 오랑캐 무리를 소탕하지는 못했지만 《춘추》와 《자치통감강목》의 뜻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충렬왕(忠烈王)은 고려 왕조의 훌륭한 임금이었고 안유(安裕)와 우탁(禹倬)은 고려 왕조의 이름난 신하였는데, 원(元)나라가 천하를 차지하기도 전에 서로 앞다퉈 변발을 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도 일찍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충렬왕의 시대보다 강하지도 않고 사대부들이 안유와 우탁의 무리보다 현명하지도 않으면서, 오랑캐가 천하를 차지한 것이 90년이 되었는데도 부인이나 어린아이조차도 오랑캐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송시열의 유풍(遺風)과 여열(餘烈)이 사람들에게 널리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인지가 말한 공허하고 과장된 말이라는 것은 비단 선정을 무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효종의 뜻까지도 먹칠하는 것이니 참으로 통탄할 만합니다.
예론에 이르러서는 그 말한 것이 더욱 패악스러워 차마 말하지도 못하겠습니다만 이는 이인지의 말이 아니라 윤휴와 허목(許穆)이 선정에게 화를 끼친 여론(餘論)입니다. 그 설이 몹시도 장황하여 짧은 시간 내에 다 아뢸 수 없습니다. 윤휴와 허목이 화를 부추기던 날에 송시열의 문인인 증 좌랑 송상민(宋尙敏)이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한 편의 글을 지어 선조(先朝)께 올렸는데, 지금 그 글이 세상에 간행되어 저들이 말하는 ‘사종지설(四種之說)’ 및 ‘단궁(檀弓)은 문(免)하고 자유(子游)는 최마복을 입었다.’라는 말에 대해 조목조목 다 논열하여 분명하게 밝혀 놓았으니, 살펴보아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내막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 하나면 충분하니, 신들이 덧붙여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윤휴와 허목의 뜻은 애초에 의례에 있지 않았고 단지 이 논의를 빙자하여 사적인 유감을 풀어 바름을 멸하고 나라에 화를 끼칠 계책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형국이 한번 바뀌어 고묘(告廟)할 것을 논의하였다가 재차 바뀌어 경신년(1680, 숙종6)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르러 흉악한 역모가 남김없이 다 드러났으니, 비록 그들의 유족 및 잔존 세력조차도 감히 다시 이에 대해 언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지가 갑자기 이를 끄집어내어 이렇게까지 미쳐 날뛰는 것은 갑인년(1674, 현종15)부터 기사년(1689) 사이에 흉악한 세력이 한창 치성하던 때와 다를 게 없으니, 신들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아아, 송시열은 엄정하고 강직함을 참으로 타고났으며 그가 평생토록 힘쓴 것은 실로 주자가 가르친 ‘천지가 만물을 내는 것과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것은 정직일 뿐이다.’라는 구절 하나에 있었으므로 그 행동에서 보이고 언의를 말한 것이 명백하고 순수하며 겉과 속이 다 밝지 않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었으니, 어찌 조금이라도 권모[機關]와 술수(術數)에 흡사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저 스승의 문하에서 배반을 일으킨 자들이 도리어 이 네 글자를 선정에게 가하여 그 설이 선정신 송준길과 고 참판 이유태(李惟泰)에게서 나왔다고 하여 서신에 올려 무함할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아, 송준길은 평생도록 도의로 사귄 벗이 송시열 한 사람뿐이었으며 죽음에 임박하여서는 벽에 걸린 ‘높은 산을 우러르다.[高山仰止]’라는 말을 가리키면서 ‘오직 송시열만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는데, 죽음에 임박하여서 한 말이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 평소에 권모라고 의심했겠습니까. 이러한 이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유태는 늘그막에 언의가 제법 이전과 달라 선정신을 스스로 외면하였으니,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어찌 공론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이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이고 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인데, 또 어찌 거짓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가소로운 것은 이 무리가 마치 기이한 재화라도 얻은 것처럼 거두어 모아 외우며 전파하여 송시열을 공격하는 좌계(左契)로 삼았으나, 본디 악감정이 있는 자에게서 나온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애초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아아, 송시열은 평소에 악을 미워하는 데에 매우 엄격해서 뭇 사대부들 중에 명분과 의리에 죄를 얻은 자를 반드시 엄한 말로 배척하였으니, 세도를 염려한 것이 깊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간악한 자들에게 제일 심하게 미움을 받아 결국 예상치 못한 화를 만났으니, 송시열이 송시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화를 두려워하고 이익을 쫓는 무리가 송시열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괴이할 것은 없으나 배반한 자들이 결국 간악한 역적의 무리가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배반한 자가 많은 것은 단지 배반한 자들의 불행이지 송시열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또 송시열의 만년의 아름다운 덕은 세상의 변고를 두루 겪어서 매서운 겨울날의 송백(松柏)과도 같고 거센 물살 한복판의 지주(砥柱)와도 같아서 모진 고난을 겪은 뒤 쇠락한 세상에 홀로 우뚝 서서 작은 몸뚱이 하나로 천지 강상(綱常)을 세울 중한 책임을 맡아, 명리를 바로잡아 세도를 유지하고 말로써 가르침을 남겨 후학에게 은혜를 끼쳤으니, 이는 실로 하늘이 우리나라를 보우하사 오도(吾道)를 빛낸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년(1689)의 화가 간악한 무리들이 날조한 데서 비롯하여 거의 기묘년(1519, 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