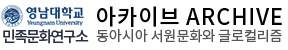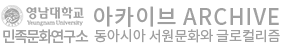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
지역
-
가평군
-
강남구
-
강동구
- 강릉시
-
강북구
-
강서구
-
강서구
- 강진군
-
강화군
-
거제시
- 거창군
- 경산시
-
경주시
-
계룡시
-
계양구
-
고령군
-
고성군
-
고성군
-
고양시
- 고창군
- 고흥군
- 곡성군
- 공주시
-
과천시
-
관악구
-
광명시
-
광산구
-
광양시
-
광주시
-
광진구
-
괴산군
- 구례군
-
구로구
-
구리시
- 구미시
-
군산시
- 군위군
-
군포시
- 금산군
-
금정구
-
금천구
-
기장군
- 김제시
- 김천시
-
김포시
- 김해시
- 나주시
- 남구
-
남구
-
남구
-
남구
-
남동구
-
남양주시
- 남원시
- 남해군
-
노원구
- 논산시
-
단양군
-
달서구
- 달성군
- 담양군
-
당진시
- 대구광역시
-
대덕구
-
도봉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대문구
-
동두천시
- 동래구
-
동작구
- 동해시
-
마포구
-
목포시
- 무안군
- 무주군
- 문경시
-
미추홀구
- 밀양시
- 보령시
- 보성군
-
보은군
- 봉화군
-
부산진구
-
부안군
- 부여군
-
부천시
-
부평구
-
북구
-
북구
-
북구
-
북구
-
사상구
- 사천시
-
사하구
- 산청군
- 삼척시
- 상주시
-
서구
- 서구
-
서구
-
서구
-
서대문구
- 서산시
- 서천군
-
서초구
-
성남시
-
성동구
-
성북구
- 성주군
- 세종시
-
속초시
-
송파구
-
수구
- 수성구
-
수영구
-
수원시
-
순창군
- 순천시
-
시흥시
-
신안군
-
아산시
- 안동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구군
- 양산시
-
양양군
-
양주시
-
양천구
-
양평군
- 여수시
-
여주시
-
연수구
-
연제구
-
연천군
- 영광군
- 영덕군
-
영도구
-
영동군
-
영등포구
- 영암군
-
영양군
- 영월군
- 영주시
- 영천시
-
예산군
-
예천군
- 예천군
-
오산시
-
옥천군
-
옹진군
-
완도군
-
완주군
-
용산구
-
용인시
-
울릉군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울진군
- 원주시
- 유성구
-
은평구
-
음성군
- 의령군
- 의성군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익산시
-
인제군
- 임실군
- 장성군
- 장수군
- 장흥군
- 전주시
-
정선군
- 정읍시
- 제주시
-
제천시
-
조치원읍
-
종로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랑구
-
증평군
-
진도군
- 진안군
- 진주시
-
진천군
- 창녕군
- 창원시
-
천안시
-
철원군
- 청도군
-
청송군
-
청양군
-
청주시
-
춘천시
-
충주시
- 칠곡군
-
칠곡군
-
태백시
-
태안군
- 통영시
-
파주시
-
평창군
-
평택시
-
포천시
- 포항시
-
하남시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함평군
- 합천군
- 해남군
- 해운대구
-
홍성군
- 홍천군
-
화성시
- 화순군
-
화천군
-
횡성군
-
가평군
- 건립시기
- 자료
간략정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61 (이도일동, 제주성지) |
| 건립연도 | 1578 |
| 문화재 지정 표기 | |
| 제향인 | |
| 기타 | 서원 |
관찬사료
영조 14년(1738) 8월 10일 경인
병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성품이 분별없고 어리석지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매번 조정의 일에 대해, 일의 경중과 대소를 따지지 않고 혹 마음에 불가한 것을 보면 늘 숨기지 않고 다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직이 높아질수록 근심이 많아지고 이쪽저쪽에서 방해를 받아 혹 흐지부지 덮어 버릴 때가 있기도 하였으니, 신이 마음속으로 성상께서 후하게 대우해 주신 은혜를 저버린 듯하여 스스로를 어루만지며 자책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안동의 서원에 대한 일은 실로 나라의 작은 근심이 아니니, 신에게 삼가 구구한 우려가 있습니다. 신이 한번 입 밖으로 말을 내면 신에게 이익은 하나도 없고 온갖 해악이 생길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신하가 우물쭈물하며 침묵하는 와중에 신이 홀로 앞장서서 나아가 말했으니, 진실로 천하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신이 감히 그것을 말한 것은 실로 한결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에서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은 안동에 이미 족당도 없고 친지도 없으니 털끝만큼이라도 무슨 미련이 있어 당인들이 갖가지로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을 무릅쓰고 즐거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건대 신은 마음에 거의 양해하여 용서할 수 있으나, 남들의 망측한 비난이 어찌하여 이렇게 극에 달한 것입니까.
조중직(趙重稷)의 계사에서는 ‘대현(大賢)을 존숭하는 사류는 배격하고도 부족하여 무함하고 욕하는 말이 낭자하고, 절의를 멸시하는 흉도는 온 마음을 다하여 비호하고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였고, 이진(李瑨)의 상소에서는 ‘저 권세 있는 재신(宰臣)이 다만 사사로운 당쟁에 본성을 잃어서 이미 백 년 전에 죽은 선정신에게 도리어 원한을 풀고자 했다.’라고 하였고, 홍계유(洪啓裕)의 상소에서는 ‘괴이하게도 연석(筵席)에서 도리어 난민을 비호하는 주장이 나와, 마침내 위세를 떨쳐 말이 겁주는 데 가까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신이 현재 도마와 칼을 쥔 저들에게 결딴이 났으니, 지금 이렇게 갖가지로 논단하는 것이 비록 지극히 참혹하고 지독하더라도 또한 더 이상 어찌하겠습니까.
예로부터 서원의 창건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도덕과 절의를 지닌 자가 있으면,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유생들이 감흥을 일으키고 의견을 내놓아서 각자 사재를 덜어서, 태어나 늙어 간 고향에 서원을 창건하기도 하고 머물다간 자취가 있는 지역에 창건하기도 하여 계절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선비들도 거처하며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쓰는 장소로 삼아서, 덕을 높이고 가르침을 익히며 몸을 깨끗이하고 행동을 삼갔습니다. 그리하여 크게는 국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었고 작게는 향당에게 본보기로 여겨졌으니, 서원이 교화를 두텁게 하고 풍속을 좋게 바꾸는 것이 이처럼 치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림이 사액을 청할 적에 어떤 서원은 ‘도덕’으로써, 어떤 서원은 ‘절의’로써 청한 까닭입니다. 조정에서 이에 덕과 행실을 살펴 허락할 만한 경우는 허락할 뿐이었으니, 애초에 어찌 서원을 창건하는 일에 간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근년(近年) 이후로 사원에 또한 폐단이 생겼습니다. 경상(卿相)의 지위에 오른 자가 반드시 모두 말할 만한 덕과 기술할 만한 행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고기를 먹고 부귀를 누리며 생을 마친 자에 불과한데, 몇 명의 자식이 과거에 급제해 어버이를 현양(顯揚)하면 주(州)나 현(縣)에서 스스로 현사(賢士)라고 일컫는 자들, 빈천하고 무식한 양반들, 부호로서 군역을 면하고자 하는 한산인(閑散人)들이 곧 서원 건립에 대한 의론을 창도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이름을 떨친 본가의 자제들’이 각 도의 아는 감사, 병사, 수령에게 요청하고 전포(錢布)를 실어 보내 서원 하나를 크게 창건하여 단청을 찬란히 꾸밉니다. 세력이 있으니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한 도(道) 경내의 백성의 집안 중 조금 넉넉하다고 치는 자들은 군역에 매일까 두려워하고 사대부를 선망해서, 온갖 청탁을 하여 돈을 납부하고 서원에 들어가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므로 세력이 있어 서원 한 곳에 들어가 몸을 의탁하는 자가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고 적은 경우도 1, 2백 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른바 원임(院任)들은 돈을 징수하고 쌀을 거두어 곧 세금을 걷는 관리나 마찬가지이고 닭을 삶고 개를 잡아 한바탕 술판을 벌입니다. 수령인 자가 이들을 군액(軍額)에 보충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본가에 대해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있다거나 친숙한 사이라는 것에 구애되고, 이른바 원유(院儒)들이 초청하여 상석에 앉히고 술과 고기를 대접하니 서원에 속한 원생(院生)은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백골징포(白骨徵布)나 인징(隣徵), 족징(族徵)의 폐단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수령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을 거스르면 번번이 서로 통문(通文)을 돌려 수령을 쫓아 버리고야 마는 지경에 이르니, 지방에서 받는 폐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정신 김상헌의 후손 김창흡(金昌翕)은 근래의 고사(高士)이니,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서원의 폐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김창흡의 시에 ‘퇴계(退溪)가 처음 백운서원(白雲書院)을 세웠으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혁신할 길 여기 있다고 여겨서였네. 그러나 술과 고기만 풍성하고 글 읽는 소리 끊겼으니, 도도한 온갖 폐단을 후세 사람이 알고 있네.’라고 하였으니, 신은 여러 번 반복해 읽고서 무릎을 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갑술년(1694, 숙종20) 11월 모일(某日)에, 선정신 박세채(朴世采)가 서원의 폐단을 아뢰고 서원의 첩설(疊設)을 금지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그중 문묘에 종사하는 여러 현인(賢人)과 큰 명현(名賢)은 또한 특별하게 대우하는 방도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수해(李壽海)가 끌어와서 상소에서 아뢴 내용입니다. 그 후 서원의 폐단이 날로 더욱더 심해져서 실로 나라를 좀먹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숙종대왕(肅宗大王)께서 이러한 폐단을 통촉하여, 곧 계사년(1713) 7월 모일에 소결(疏決)할 때 신하들의 진달을 기다리지 않고 특별히 하교하기를 ‘무릇 천하의 일은 반드시 일률적인 법이 있은 뒤에야 폐단을 구제할 수 있다. 서원의 폐단은 말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로 인해 향교가 도리어 서원보다 경시되니, 일의 체모가 몹시 온당치 못하다. 서원의 첩설을 금지하는 일에 대해 그동안 신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끝내 명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사액을 청하는 상소가 어지럽게 나와 그치지 않으니, 이는 일률적인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후로 문묘에 종사하는 유현(儒賢)이라도 서원이 첩설된 곳을 엄히 금단하도록 영원히 정식으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숙종대왕의 말씀이 훌륭하니, 아, 감히 잊겠습니까.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선왕의 뜻을 잘 따르소서.
서원을 세우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성심(聖心)을 굳게 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엄하게 막으신다는 것을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고(故) 봉조하 최규서(崔奎瑞)는 나라의 큰 원로이니, 그의 청렴함은 나약한 자가 뜻을 세우게 할 만하고 그의 공은 종묘사직을 보존하여, 한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부지한 데 대한 은혜로운 포장(褒奬)이 천고에 빛날 만하거늘, 유독 용인(龍仁) 유생의 상소에 대해서도 몇 칸의 집에 최규서의 신주를 봉안하여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선정신 김상헌을 향사하는 장소로는 개성부(開城府)에 숭양서원(崧陽書院)이 있어 그를 배향하고, 양주(楊州)에 석실서원(石室書院)이 있어 그를 병향(幷享)하고, 정주(定州)에 명봉서원(鳴鳳書院)이 있어 그를 병향하고, 제주(濟州)에 귤림서원(橘林書院)이 있어 그를 배향하고, 정평(定平)에 망덕서원(望德書院)이 있어 그를 병향하고, 종성(鍾城)에 종산서원(鍾山書院)이 있어 그를 배향하고, 의주(義州)에 고구려 을파소(乙巴素)의 사우(祠宇)가 있어 그를 배향하고, 상주(尙州)에 화동서원(化東書院)이 있어 그를 병향하고, 광주(廣州)에 현절사(顯節祠)가 있어 그를 주향(主享)하니 모두 합하여 9개의 서원이 있는데, 배향하는 곳이 4개 서원이고 병향하는 곳이 4개 서원이고 주향하는 곳이 1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수해는 상소에서 ‘안동에 서원을 첩설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양주의 석실서원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석실서원은 바로 선정신 김상헌을 그의 형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과 함께 합향(合享)한 장소인데 위패의 순서가 김상용을 상석(上席)에 두었으니, 선정신은 주향하는 다른 서원이 또 없습니다.’라고 했으니, 어째서 이렇게 전하를 속인 것입니까. 그리고 그의 상소에서 또 당색을 가지고 장황하게 분변(分辨)하였는데, 영남의 대가들을 상소에 언급하기까지 한 것은 참으로 이미 온당치 않고 그 대가들이 반드시 전부 그의 말과 같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고 충신 하위지(河緯地)와 증 영의정 홍익한(洪翼漢)의 자손들이 영천(榮川)과 순흥(順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경상 감사로 있을 적에 절의를 지킨 집안의 자손들을 존문(存問)하고자 하여 고을에서 찾아보았더니, 하위지는 후손이 없었고 순흥에는 단지 홍익한의 방손(傍孫)만 있었습니다. 이 말이 성상의 총명함을 현혹하려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또 어찌 이처럼 허황되고 망녕되단 말입니까.
아, 선정신의 순수한 충정과 큰 절의는 만고에 추앙받는다는 내용을 신이 연석에서 이미 말한 바 있으니, 조중직의 계사와 홍계유, 이진의 상소는 한결같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남을 무함한단 말입니까. 생각건대 우리나라 한 지역이 의관과 신을 바꾸지 않아 오랑캐처럼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선정신이 천하에 대의를 환히 밝힌 공입니다. 나라 안에 꿈틀대며 살아 있는 자들 중 누군들 선정신을 존경할 만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신이 비록 우매하지만 또한 이 뜻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 선정신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조중직, 홍계유, 이진의 무리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남을 모함하고 능욕하고자 했으니, 권위에 의지해 거짓으로 꾸며 공갈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저 당인(黨人)들의 본래 수법이니 또한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보건대 저 영남의 학가산(鶴駕山) 아래는 선정신이 생을 마친 곳이니, 사리(事理)로 논하건대 9개의 서원에 선정신을 봉향(奉享)하기 전에 마땅히 이곳에 먼저 서원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이 어째서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서원을 세우는 일이 국가에 달려 있지 않고 유생에게 달려 있었으므로, 안동의 유생이 건립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의 감사와 수령 중에 또한 어찌 선정신을 흠모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지금까지 아직도 서원을 세우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정신이 죽은 뒤에 우리 효종(孝宗), 현종(顯宗), 숙종대왕이 절의를 숭상하고 충정을 표창한 것이 모든 왕들 중에 빼어났고, 또 선정신 윤선거(尹宣擧),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 박세채 등 여러 사람이 아래에서 잘 보좌하여 절의를 현향하는 데 관계된 모든 일에 전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선정신을 위해 이곳에 사당을 세웠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서원의 건립 여부가 한결같이 향촌의 의론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것이 설령 도내(道內) 선비들의 논의가 한목소리로 완전히 똑같아서 소장을 올려 건립을 청하고 감사와 수령이 이어서 또 청하며 조정의 신하들도 따라서 도와서 이루어 주는데, 신만 홀로 숙종께서 서원의 첩설을 금지하는 특교를 내리신 것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질질 끄는 것이라 하더라도, 신이 어찌 명의(名義)에 털끝만큼이라도 죄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 서원을 세운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일이 없고 수령이 논하여 보고한 일이 없으며 감사도 조정에 여쭈어 알리지 않았는데, 성고(聖考)의 법령을 따르지 않고 곧바로 급작스레 서원을 창건했으니, 신이 아뢴 내용에 또 무슨 비난할 만한 점이 있겠습니까.
아, 돌아보건대 서원을 앞장서서 세운 이 사람은 본래 영남의 흉악한 종자가 겉모습만 바꾼 것이요, 이 외에는 떠돌다 타향에 머물러 사는 사대부와 신씨(申氏), 강씨(姜氏) 몇 명과 어영청의 보인(保人) 김수문(金壽文)의 아들 김창적(金昌迪) 등 몇몇 무리일 뿐입니다. 안택준(安宅駿) 형제는 바로 탐리(貪吏) 안연석(安鍊石)의 아들입니다. 안연석이 처음에 선정신 김장생(金長生)을 배향한다는 논의를 듣고 통문을 보내 배향해서는 안 됨을 지적하여 말하기를 ‘아무개는 여항에서의 훌륭한 부로(父老)요, 사대부 사이에서의 훌륭한 자제일 뿐이다.’라고 하였고, 끝에서 말하기를 ‘아무개를 배향한다면, 저자에서 억울하게 죽은 숙손통(叔孫通)이 두 눈을 부릅뜨고 뛰어 들어올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선정신 송시열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의 모질고 패악한 욕지거리는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안연석이 선정신을 이처럼 욕하고 사림에게 이처럼 죄를 얻어서, 비록 사문(斯文)의 정당한 논의라도 한번 안연석의 입을 거치고 나면 곧장 빛을 잃을 것이니, 사림에 있어서는 사림의 수치가 되고 선정신에 있어서는 선정신의 수치가 됩니다. 저 조중직 무리는 스스로 선정신을 호위한다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도리어 안연석의 아들 안택준의 무리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칭찬한 말에 기대고자 하여 안택준 무리를 추켜올려 서원을 창건한 종주(宗主)로 삼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설령 안택준 무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선정을 위해 서원을 세웠더라도 참으로 이미 한 도의 수치가 됩니다. 하물며 그들이 서원을 세운 본래의 계책은 실로 이 서원의 권위에 의지하여 안으로는 양정(良丁)을 불러 모아 자기 한 몸의 소굴로 만들고 밖으로는 한 고을을 병합하여 무한한 변괴를 만들어 내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원을 선정신의 옛 집터에 세우지 않고 도리어 고을을 둘러싼 성의 중간에 세운 것입니다. 대개 그들의 뜻은 조만간 좋아하는 감사와 수령을 얻어 향교를 빼앗고 이어서 여러 서원을 다 점유한 뒤에, 이름을 삭제하고자 하면 이름을 삭제하고 부황(付黃)하고자 하면 부황하며 과거를 못 보게 하고자 하면 과거를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니, 머지않아 침해하여 억압해서 등용하거나 내쳐 조종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한 지역을 다 변화시켜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참으로 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안동은 사대부들의 집결지로 한 도의 중추가 되어, 그중에 명신의 후예가 많아 본디 대대로 지켜 오는 논의를 갖고 있으니, 지금 비록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더라도 어찌 기꺼이 안택준의 무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명을 듣겠습니까. 형세상 필시 큰 다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피차를 막론하고 다투면 격발하게 되고 격발하면 변란이 생기게 되니, 변란이 생기는 것은 나라의 근심거리입니다. 신이 수십 년 동안 조정에서 쟁탈할 때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져 격렬한 다툼이 결국 국가의 무궁한 화가 된 상황을 모두 겪었습니다. 이로써 저기에 징험해 보아도 또한 똑같으니, 이것이 우려할 만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우려하는 점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정유년(1717) 11월 모일에, 예안(禮安)의 유생들이 선정신 이이(李珥), 김장생, 송시열의 서원을 세우기를 청하는 일로 여러 날 동안 상소를 올리자, 고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연석에 나아가 아뢰기를 ‘지금 이렇게 영남 유생들이 서원을 세우기를 청한 이들 가운데 세 현인은 혹 이미 문묘에 올라 있고 혹 서원이 거의 온 나라에 두루 있으니, 다시 서원을 첩설하지 않더라도 현인을 높이고 덕을 숭상하는 도리에 어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서원을 세운 뒤에 도리어 유생들이 서로 다투어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있으니, 또한 선비들이 지향을 바로잡는 데 반드시 보탬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상소 봉입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라고 하니, 숙묘께서 하교하기를 ‘서원의 폐단이 근래보다 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하여 서원의 첩설을 금지했다. 그러나 그사이에 또한 어찌 필요성의 차이가 없겠는가. 하지만 이미 금령을 내린 뒤이니, 혹여 잇따라서 명을 바꾸어 고친다면, 그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 봉입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승지 조도빈(趙道彬)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 하교하신 뒤이니, 임금의 묘정(廟庭)에 배향한 대현이라도 서원을 첩설하지 말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숙묘께서 하교하기를 ‘그대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 민진후는 나라의 충신으로, 그가 나라를 걱정한 말이 이와 같았으니, 신이 걱정하는 것도 어찌 다르겠습니까. 민진후가 연석에서 아뢸 때에 대관(臺官)과 유신(儒臣) 중에 또한 어찌 세 현인을 존모(尊慕)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세 현인을 위해 민진후를 배척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해주(海州), 연산(連山), 회덕(懷德) 세 서원의 유생 중에 오늘날 양주의 유생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으니, 조중직이 ‘사류를 무함하고 욕했으며, 절의를 멸시했다.’라고 한 말, 홍계유가 ‘마침내 위세를 떨쳐 말이 겁주는 데 가까웠다.’라고 한 말, 이진이 ‘당쟁에 본성을 잃어서 선정신에게 원한을 풀고자 했다.’라고 한 말은 유독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신이 지금 예전 사람들이 당한 적이 없던 치욕을 무릅쓰고서도 오히려 다시 힘써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어찌 아무런 까닭이 없겠습니까.
대저 삼남(三南) 지역은 산천과 풍기(風氣)가 같지 않습니다. 호서(湖西) 백성은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지만 심지(心志)가 굳건하지 않습니다. 호남(湖南)의 백성은 교활한 데다가 또 간사하여 지키는 바가 자주 변화하고, 간간이 이름난 유학자와 명신을 배출했으나 많이 알려진 적이 없으며, 역적이 있더라도 또한 대단히 교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산천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 풍기가 견고하지 않은 탓입니다. 영남의 경우에는 산이 에워싸 높은 봉우리가 두껍게 있고 하천은 흘러서 같은 곳으로 모여들어, 크게 완결된 형세를 이루고 있으며 넓이가 몇천 리는 됩니다. 원기가 혼후하고 성대하여 사람이 그 사이에서 태어나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우리 왕조 300여 년 동안에 쓸모 있는 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조정의 사대부들과 여항의 뭇 백성들이 영남에 비조를 둔 자가 열에 일고여덟입니다. 우리 왕조 300여 년의 대유(大儒)는 오현(五賢)이 가장 성대한데, 그중 네 명의 현인이 영남 출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뒤로 큰 흉적은 견훤ㆍ궁예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두 흉적도 영남 출신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산천의 기운이 모이고 풍기가 빚어낸 것이니, 현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큰 현자가 되고 악인이 태어나면 반드시 큰 악인이 됩니다. 그러니 저 영남이 영남인 까닭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묘(中廟)로부터 인조대왕의 조정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훌륭한 신하들이 더욱 배출되었는데,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국가 사업에 힘쓰기도 하고 명분과 절의를 세우기도 했으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가 영남에 힘입은 것이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남은 인재가 거의 없어 실로 진작하여 흥기할 가망이 없으니, 이는 조정에서 인재를 배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인재를 배양하여 성취시킬 수 있다면, 훗날 남쪽과 북쪽에 우환이 있더라도 국가가 필시 힘을 얻을 때가 있을 것임을 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 영남을 버린 것은 기사년(1689)에 명의에 죄를 지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수를 넘어 의리를 거스른 기사년의 당인(黨人)들은 죄가 하늘까지 닿았으니, 동시대에 조정에 있던 영남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론하고 어찌 버려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갑술년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또 기사년에 죄를 지은 자의 자손이 아닌 경우는 명의를 위배했다는 죄과에 함부로 몰아넣어서는 않되거늘 명철하신 성상의 시대에도 여전히 전부 금고(禁錮)하는 것은 어찌 이런 이치가 있단 말입니까.
아, 혼조(昏朝) 때 정청(庭請)한 자들도 명의에 대한 만고의 죄인이지만, 만약 본심을 따져 보지 않고 정청에 따라가 참여한 자들의 자손을 모두 금고한다면, 오늘날 조정에 또한 어찌 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기사년에 명의를 위배한 데 대한 처벌이 어찌 죄를 짓지 않는 자의 자손에게까지 미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연 명의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만원(李萬元), 이후항(李后沆) 무리는 역적 민암(閔黯)이 방자하게 날뛰던 때에 그 당(黨)에서 빠져나와 절의를 세울 수 있었던 자들이니, 장려해 끌어올리고 바로 세워 주는 것은 마땅히 이 무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손으로 과거에 급제한 자들이 여전히 정권을 잡은 자들의 자제 뒤에 끼지 못하니, 이와 같은데도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말해 보건대 정권을 잡은 자들이 영남의 무고한 사람들을 배격하는 것은, 단지 사사로이 편당하는 데 빠져 다른 당인을 공격하는 데 급하여서 권위에 기대는 논의와 범하기 어려운 의론을 설정하여 자신과 의견이 다른 자를 옭아매려고 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의도가 오로지 명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당론이 극심해져 화복(禍福)이 생기고, 화복이 생겨서 차마 역적이 되어 각 당에서 모두 역적을 배출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무신년(1728, 영조4)의 난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천하 만고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도 속마음이 끓고 아프니, 그들의 살점을 먹고 살가죽을 벗겨 덮더라도 어찌 만에 하나라도 분을 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남을 미워하는 자들이 각 당에서 모두 역적을 배출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영남 사람에게만 질책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어찌 오직 영남 사람만이 완전히 역적의 종자여서 충성스럽고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겠습니까.
영남상도(嶺南上道)는 선정신 이황(李滉)이 살았던 곳인데, 이황은 예양(禮讓)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황의 유풍이 미쳐서 사람들에게 참람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영남하도(嶺南下道)는 문정공(文貞公) 조식(曺植)이 살았던 곳인데 조식은 기개와 절조를 숭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류의 폐단이 법도를 따르지 않아 비로소 정인홍(鄭仁弘)과 같은 흉역이 나와서, 끝내 정희량(鄭希亮)의 반역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정희량은 영남하도 출신으로서 영남상도의 순흥에 옮겨 가 우거했는데, 군사를 일으킬 적에는 감히 상도에서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도에서 일으켰습니다. 《감란록(勘亂祿)》의 정의련(鄭宜璉)의 공초를 가지고 보더라도, 이능좌(李能佐)가 예천(禮泉)에 와서 크게 분노하고 돌아가며 말하기를 ‘안동 놈들 때문에 우리의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보건대, 유몽서(柳夢瑞), 권덕수(權德秀) 무리처럼 안동에서 역적의 사정을 안 자들은 안동 사람들이 결코 역적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헤아리고서 이렇게 응대한 듯합니다. 이 때문에 신과 조현명(趙顯命)이 매양 ‘영남의 역적이 지나치게 창궐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니 안동에 힘입은 바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성상의 별유(別諭)에서 ‘이름난 고을의 충효의 풍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한 말씀이 진실로 지당합니다.
그렇지만 권덕수, 유몽서 무리가 누차 역적의 공초에서 거론된 이상 이미 역적의 실정을 알았던 셈이니, 단호히 왕법대로 시원스레 처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성상의 하해(河海)와 같고 하늘과 같은 큰 은덕으로 오히려 천지 사이에서 목숨을 건졌으니, 이는 실로 국가에서 대단히 형법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이 무리가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영남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고, 이 무리가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영남을 함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성조의 관대한 은전 때문에 마침내 영남의 영원한 누가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국법을 바로잡고 물정을 안정시키는 도리이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종전에 연석에서 이 무리들에게 형법을 잘못 적용했음을 아뢴 까닭입니다.
신은 권덕수, 유몽서 무리에게 속히 나라의 형법을 시행하여 역적의 사정을 안 죄를 올바로 다스리고, 그 나머지 죄 없는 자들에게는 또한 안택준이 함부로 몰아가는 폐단을 엄히 금하기를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은 안동의 화가 장차 그치지 않을까 두려우니, 안동의 화가 그치지 않는다면 영남의 환란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말하건대 신이 우려하는 바가 과연 공적인 데서 나온 것입니까, 사적인 데서 나온 것입니까. 저 당인들이 번갈아 신을 욕하는 것은 과연 사적인 데서 나온 것입니까, 공적인 데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 공정한 눈이 있다면, 다소 다투어 논란할 필요 없이 누가 공을 위하고 누가 사를 위하는지 즉시 결판날 것입니다.
또 신은 서원을 훼손한 유생들이 죄를 받은 일에 대해 몹시 공평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고 상신 민진원이 전라 감사로서 하직 인사를 할 때 아뢰기를 ‘서원을 새로 세우는 일은 반드시 상소를 올려 세우기를 청하고 조정의 허락을 기다린 뒤에야 서원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선비의 풍습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먼저 스스로 서원을 짓고 이미 지은 뒤에야 비로소 상소를 올려 사액을 청합니다. 조정에서 첩설한 것이라 하여 사액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이미 서원을 세운 뒤이니 그 폐단이 사액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 먼저 스스로 서원을 세우면 해당 수령을 논죄하고 앞장서 주장한 유생을 정거(停擧)하도록 통지하여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숙묘께서 하교하기를 ‘서원의 폐단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아뢴 말이 진실로 옳으니 그대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 국가에서 금령을 세운 것이 이처럼 이미 엄격하니, 조정에 여쭈지 않고 서원을 건립한 자는 국법상 마땅히 정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장서서 서원을 세운 안택준의 무리는 어찌하여 정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서원을 훼손한 것은 참으로 패악한 행동이니 정배(定配)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훼손한 자는 이미 정배했는데, 앞장서서 세운 자들은 어찌하여 홀로 정거를 면한 것입니까. 서원을 세운 것과 서원을 훼손한 것은 각각 그 죄가 있고, 정거와 정배는 처벌의 경중이 현격히 다릅니다. 그런데 세운 자는 오히려 가벼운 처벌도 면했고, 훼손한 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형법이 이처럼 공평함을 잃었는데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연석에서 대신이 서원을 훼손하는 일을 앞장서 주장한 유생들을 형추(刑推)하고 정배하기를 청했습니다. 신이 이에 이어서 아뢰기를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필시 많은 사람들이 감영(監營)에서 칼을 쓰고 거듭 형추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여러 의견이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동부 겸관(兼官) 영천 군수(榮川郡守) 심정기(沈廷紀)가 안동의 좌수(座首) 김몽렴(金夢濂)을 두 차례 형추했고, 사인 김경헌(金景瀗), 황우청(黃又淸)을 두 차례 형추했고, 유정화(柳鼎和)를 한 차례 형추했으며, 그 외에 또 잡아와 가둔 사람이 있는데 전 감사 윤양래(尹陽來)가 또한 난민(亂民)에 대한 형률로 다스리고 감영에 몰래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풍문이니 믿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비변사 당상 여러 사람의 말을 듣건대, 이른바 영남 유생이 상소를 올리고자 하였으나 올려지지 않아 대신에게 세 번 글을 올렸으니, 그 제사(題辭)에 ‘줄곧 널리 처벌하니 또한 조정에서 형벌을 신중히 적용하는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널리 처벌하고 함부로 형벌을 적용하니 몹시 괴이한 일입니다.’라고 하고, 또 ‘조정의 명령에, 앞장서 주장한 사람이란 많은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고 형추하라고 한 것은 여러 번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하니, 유생들이 거듭하여 형추를 받은 것이 과연 진실대로 전해진 말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저 형추를 받은 김몽렴은 선묘(宣廟) 때의 명신 김성일(金誠一)의 후손이고, 김경헌은 선조(先朝)의 교리 김여건(金汝鍵)의 아들이고, 유정화는 장령 유경립(柳經立)의 손자입니다. 이들은 높은 벼슬아치의 후손이고 또한 선비로 칭해지니, 그들에게 비록 죄가 있더라도 조정의 명령에 어찌 일찍이 ‘한사코 형신(刑訊)하라.’라는 하교가 있었습니까. 또 조정에서 단지 ‘앞장서 주장한 한 사람을 형추하고 정배하라.’라고만 명했으니, 여러 유생을 널리 처벌한 것은 이미 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70세가 된 늙은 좌수 김몽렴을 엄하게 처벌한 것은 또 법에서 벗어난 일 중에서도 더욱 법에서 벗어난 일이니, 어찌 이런 거조가 있단 말입니까. 신은 삼가 나라를 위해 근심합니다.
아, 신이 이 일에 대해 이처럼 장황하게 말했으니, 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신을 비웃으며 ‘처세하는 방법에 어둡다.’라고 할 것이요, 신을 아는 자는 반드시 신을 걱정하여 ‘나라를 지나치게 근심한다.’라고 할 것이며, 신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신을 무함하여 ‘흉당(凶黨)을 도와서 보호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리로 미루어 보건대 권세가 없는 자는 배척하여 버리고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영합하니, 지금 영남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만약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권세가 없는 자들을 도와서 보호하는 일이 도리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도와서 보호하는 것은 도당을 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현재 임금의 은혜를 입어 부귀가 극에 달해 안하무인격이라도 또한 도당을 결성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신이 비록 당목(黨目)에 속한 사람이지만 성품이 구차하게 살지 못하여, 일의 시비를 논함에 옳은 일은 옳다고 하고 그른 일은 그르다고 하여 우리 당이라 해서 이쪽을 도와주지 않으며 다른 당이라 해서 저쪽을 억누르지 않고 오직 일의 옳고 그름에 따랐을 뿐입니다. 신이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은 평상시 신이 주대(奏對)한 내용을 가지고 보더라도 거의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사려가 원대하니 혹여 여유가 있을 때 신이 올린 상소의 대의(大意)를 자세히 곱씹어 본다면, 신의 말이 진실로 왕실을 위하는 뜻에서 나왔음을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속담에 이르기를 ‘조총(鳥銃)이 나온 뒤에는 항우(項羽)도 힘을 쓸 수 없고, 치우친 논의가 나온 뒤에는 제갈량(諸葛亮)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으니, 이처럼 동당벌이(同黨伐異)하는 시대에 신의 말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더라도 오직 하늘과 땅만이 그것을 알뿐 그 누가 믿겠습니까. 이 때문에 대관의 계사와 유신의 상소에서 신을 ‘동당벌이한다’라고 무함한 것이니, 이는 실로 신의 처지가 매우 편치 못한 점입니다. 그리고 양주 유생의 상소에서는 쟁론하는 말 이외에 갑자기 신을 ‘권세 있는 재신’이라고 지목했고, 또 ‘조정의 권력을 가지고 논다.’라는 말 등으로 모함하려 했으니, 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꿈에서조차 깜짝 놀랍니다.
아, 신은 경술년(1730)에 경상 감사에서 조정으로 돌아와 6년 동안 맡은 관직이 대부분 한가로운 벼슬자리였습니다. 작년부터 비로소 외람되이 권요직(權要職)을 맡았으니 헤아려 보건대 10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병권을 맡은 10개월 동안 끝없는 남들의 비난이 이미 몹시 참혹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서 즉시 놓지 않는다면, 남들의 비난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귀신도 필시 꺼릴 것이니, 이것이 신이 크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까닭입니다. 이에 감히 눈물을 흘리며 전부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신의 간절함을 헤아려서 속히 신이 맡은 직임을 체차함으로써 뭇 사람들의 노여움에 답하고 신이 갑작스러운 화란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신이 상소를 지어 올리려고 할 즈음 누차 명을 어긴 상태에 소패가 또 갑자기 내렸으니 몹시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하 된 도리에 마땅히 명을 따라야 하지만 이상 아뢴 바와 같은 신의 형편으로는 실로 명을 받들 길이 없습니다. 신이 이에 더욱 만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신은 두렵고 떨리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바라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하니, 이익정에게 전교하기를,
“아뢰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장황하게 말했으니, 도로 내주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