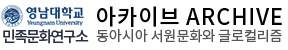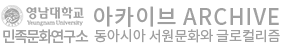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
지역
-
가평군
-
강남구
-
강동구
- 강릉시
-
강북구
-
강서구
-
강서구
- 강진군
-
강화군
-
거제시
- 거창군
- 경산시
-
경주시
-
계룡시
-
계양구
-
고령군
-
고성군
-
고성군
-
고양시
- 고창군
- 고흥군
- 곡성군
- 공주시
-
과천시
-
관악구
-
광명시
-
광산구
-
광양시
-
광주시
-
광진구
-
괴산군
- 구례군
-
구로구
-
구리시
- 구미시
-
군산시
- 군위군
-
군포시
- 금산군
-
금정구
-
금천구
-
기장군
- 김제시
- 김천시
-
김포시
- 김해시
- 나주시
- 남구
-
남구
-
남구
-
남구
-
남동구
-
남양주시
- 남원시
- 남해군
-
노원구
- 논산시
-
단양군
-
달서구
- 달성군
- 담양군
-
당진시
- 대구광역시
-
대덕구
-
도봉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구
-
동대문구
-
동두천시
- 동래구
-
동작구
- 동해시
-
마포구
-
목포시
- 무안군
- 무주군
- 문경시
-
미추홀구
- 밀양시
- 보령시
- 보성군
-
보은군
- 봉화군
-
부산진구
-
부안군
- 부여군
-
부천시
-
부평구
-
북구
-
북구
-
북구
-
북구
-
사상구
- 사천시
-
사하구
- 산청군
- 삼척시
- 상주시
-
서구
- 서구
-
서구
-
서구
-
서대문구
- 서산시
- 서천군
-
서초구
-
성남시
-
성동구
-
성북구
- 성주군
- 세종시
-
속초시
-
송파구
-
수구
- 수성구
-
수영구
-
수원시
-
순창군
- 순천시
-
시흥시
-
신안군
-
아산시
- 안동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구군
- 양산시
-
양양군
-
양주시
-
양천구
-
양평군
- 여수시
-
여주시
-
연수구
-
연제구
-
연천군
- 영광군
- 영덕군
-
영도구
-
영동군
-
영등포구
- 영암군
-
영양군
- 영월군
- 영주시
- 영천시
-
예산군
-
예천군
- 예천군
-
오산시
-
옥천군
-
옹진군
-
완도군
-
완주군
-
용산구
-
용인시
-
울릉군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울진군
- 원주시
- 유성구
-
은평구
-
음성군
- 의령군
- 의성군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익산시
-
인제군
- 임실군
- 장성군
- 장수군
- 장흥군
- 전주시
-
정선군
- 정읍시
- 제주시
-
제천시
-
조치원읍
-
종로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구
-
중랑구
-
증평군
-
진도군
- 진안군
- 진주시
-
진천군
- 창녕군
- 창원시
-
천안시
-
철원군
- 청도군
-
청송군
-
청양군
-
청주시
-
춘천시
-
충주시
- 칠곡군
-
칠곡군
-
태백시
-
태안군
- 통영시
-
파주시
-
평창군
-
평택시
-
포천시
- 포항시
-
하남시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함평군
- 합천군
- 해남군
- 해운대구
-
홍성군
- 홍천군
-
화성시
- 화순군
-
화천군
-
횡성군
-
가평군
- 건립시기
- 자료
간략정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본성동, 진주성) |
| 건립연도 | 1607 |
| 문화재 지정 표기 | |
| 제향인 | |
| 기타 | 사우 |
관찬사료
경상 좌병사(慶尙左兵使) 최진한(崔鎭漢)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어리석고 미천한 신은 말석에 있는 무관으로 지위가 낮고 식견이 좁아 직무를 담당하는 것도 조리 있게 처리할 겨를이 없으니, 성상을 번거롭게 하는 일에 어찌 감히 망녕되이 간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절의를 숭상하고 의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충신을 드러내고 현량(賢良)을 천거하려는 정성은 평소 마음속에 쌓여 있어 스스로 남에게 뒤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죽음을 애도하는 작은 정성으로 은미한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상께 감히 진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밝게 살펴 받아들여 주소서.
신은 신축년(1721, 경종1)에 본도에서 우병사(右兵使)의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 우병영(右兵營)은 바로 세 번 지나간 임진년(1592, 선조25)과 계사년(1593)에 창의군(倡義軍)이 온몸에 화살을 맞은 채 죽어간 곳입니다. 이곳에는 사액한 충민사(忠愍祠)와 창렬사(彰烈祠) 두 사당이 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난 뒤라 퇴락하였으므로 그 당시 본 상황을 장계(狀啓)로 보고한 뒤에 보수하였습니다.
두 사당의 위패를 살펴보았더니, 충민사는 바로 임진년에 전사한 진주 판관(晉州判官) 증(贈) 영의정 김시민(金時敏)의 위패를 단독으로 제향하는 사당이고, 창렬사는 바로 계사년에 전사한 경상 우병사 증 우참찬 최경회(崔慶會), 충청 병사(忠淸兵使) 증 좌찬성 황진(黃進), 창의사(倡義使) 증 좌찬성 김천일(金千鎰), 사천 현감(泗川縣監) 증 병조 판서 장윤(張潤), 창의사 종사관 증 승지 양산숙(梁山璹), 증 참의 김상건(金象乾), 거제 현령(巨濟縣令) 김준민(金俊民), 분의 의병장(奮義義兵將) 증 주부 유함(兪晗), 생원(生員) 이욱(李郁), 의병장 강희복(姜熙復), 수문장 장윤현(張胤賢), 판관 박승남(朴承男), 학생(學生) 하계선(河繼先), 학생 최언량(崔彦亮), 복수 의병장(復讎義兵將) 고종후(高從厚), 적개 의병장(敵愾義兵將) 이잠(李潛),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 우병영 우후(右兵營虞候) 성영달(成穎達), 첨정 윤사복(尹思復), 학생 이인민(李仁民), 의병 대장(義兵代將) 손승선(孫承先), 주부 정유경(鄭惟敬), 수문장 김태백(金太白), 학생 박안도(朴安道), 선무랑(宣務郞) 양제(梁濟), 분의 의병장 강희열(姜熙悅), 진해 현감(鎭海縣監) 조경형(曺慶亨), 판관 최기필(崔琦弼) 등 28인의 위패를 함께 제향하는 사당입니다.
신이 차례로 공손히 바라보며 경의를 표하다가 곧이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 임진년과 계사년의 왜란에 여러 군(郡)이 휩쓸려 새가 움츠리는 듯 쥐가 달아나는 듯하여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모두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왜적을 물리치는 것이었으나 그렇게 한 사람이 매우 적었는데, 저 28인의 신하들만은 똑같이 의로운 마음으로 구원도 없는 외로운 성에서 사력을 다하다 같은 날 순절하여 빛나는 의열(義烈)이 저처럼 우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왜란이 평정된 초기에 표장(表奬)하는 은전을 가장 먼저 내리고 모두 추증하는 예를 거행하여 아울러 한 사당 안에 제향하였으니, 충성스런 혼령을 위로하고 풍교(風敎)를 세우는 도리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직(贈職)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죽은 일로 함께 제사 지내면서 7인의 위패는 융숭하게 은총 어린 추증을 하였는데, 21명의 위패에 대해서만은 덩그렇게 행직(行職)을 쓰기도 하고 의병장이라 쓰기도 하며 생원이라 쓰기도 하고 학생이라 쓰기도 하였으니, 바로 이 점이 신이 의아스러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 신하가 의리를 행한 것이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 조정에서 기려 추증하는 것도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취하고 무엇은 버리며 누구는 추증하고 누구는 추증하지 않았으니, 똑같이 균등하게 은전을 베푸는 도리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보고 듣는 이들마다 얼마나 탄식하며 괴이하게 여기겠습니까. 아, 수양(睢陽)이 함락되던 날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의 죽음에 선후의 차이가 있었으나, 당(唐)나라 조정에서 융숭하게 보답하여 일절 차이가 없었던 것은 한 말 쯤의 붉은 피를 가진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여러 신하는 죽을 때 시간적인 차이도 없었는데, 필경에 은전이 같은 조정에서 다르게 시행된 것은 유독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그중에 공이 뚜렷이 드러난 사람을 취하여 비교해서 논한다 하더라도 고종후처럼 충성과 효도를 다 온전히 한 사람이 과연 김상건만 못하겠습니까. 이잠처럼 절의가 분명히 드러난 사람이 과연 양산숙만 못하겠습니까. 은혜를 연장하여 드높이고 격려하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의리인데 ‘의병장’이라고 직함을 썼으니 이 무슨 의리입니까. 왕기(汪踦)에게 상례(殤禮)를 쓰지 말라고 성인(聖人)께서는 기려 기록하였는데, ‘학생’이라고 직함을 쓴 것은 유독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으나 구구한 한 생각으로 이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임인년(1722, 경종2)에 아울러 추증을 베풀어 달라는 뜻으로 낱낱이 거론하여 급히 장계를 올렸는데, 그때 비변사가 복계(覆啓)하여 동시에 위용(威勇)을 떨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체로 추증을 받지 못한 것은, 당시 조정의 논의가 혹 참작하여 취사하는 뜻에서 나온 듯하니 1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 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이 시행되지 않고 그 일이 결국 중지되었으니, 신은 참으로 개탄스러움과 애석함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참작하여 취사하였다는 말을 집어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대체로 일이 의심스럽고 공이 피차의 구별이 있어야 참작하여 취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 신하가 순국한 절개는 이미 의심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피차의 구별도 없으니, 신으로서는 무엇을 가지고 참작하고 무엇을 가지고 취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실제 자취를 다 고찰할 수는 없으나, 사당을 세워 제향하고 편액을 하사하여 영광스럽게 한 일이 실로 왜란을 평정하고 난 초기에 행해졌으니, 그들의 죽음이 명백히 상 줄 만하다는 것은 자취를 살피지 않고도 부절(符節)의 한쪽처럼 분명히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근거할 만한 실제 자취가 정충단(旌忠壇) 앞의 비석에 뚜렷이 실려 있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양성(晉陽城)이 함락되던 날 창의사 김천일과 양산숙 등 수십 인은 북쪽을 향해 재배하고 남강(南江)에 투신하여 죽었으며, 이종인과 강희열 등 10여 인은 칼을 빼들고 왜적을 베어 죽이다 힘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인이 죽을 때에 왜적 2명을 겨드랑이에 끼고 강으로 뛰어들며 「김해 부사 이종인이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크게 고함을 질렀다.’라고 하였으니, 그 충성스럽고 장렬한 기개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쭈뼛하게 만듭니다. 우뚝 솟은 비석이 해와 별처럼 빛나고 밝고 뚜렷하여 사람의 이목을 비추고 있으니, 사실을 기록한 비문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아, 당시에 사당을 세워 함께 제향한 것이 공의(公議)에서 나왔고 중간에 비석에 새겨 꽃다운 이름을 함께 드러낸 것이 또한 실제 자취이니, 여러 신하의 뚜렷이 드러나는 심사는 천지에 통하고 고금에 이어지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조정의 의론 또한 어찌 사후의 애모와 추증을 아껴 따로 참작하여 취사했겠습니까. 저 미천한 하인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상 줄 만한 일이 있으면 보답하는 도리상 분별하여 대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여러 신하의 충성으로 모두 똑같은 절개를 갖추었는데, 증직하는 은전에서만 무슨 차등이 있겠습니까.
오래전의 일이라 짐작할 수는 없으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널리 수집하고 어리석은 신의 미천한 생각을 참고한다면, 왜란을 겨우 평정한 초기에 정사가 많아 겨를이 없던 시기에 증직을 청한 도신(道臣)이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명을 받든 예관(禮官)이 혹 소홀히 한 폐단이 있었는데도 어영부영하며 지금까지 온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소치일 것입니다. 이 어찌 참작하여 취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는 말은 더욱 그렇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뛰어나게 우뚝한 절개와 열렬한 명성이 있다면, 혹 당시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해도 후대에서 표창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우리 성조(聖朝)에서 융숭히 장려하여 정표(旌表)하는 도리는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신이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으니 임진왜란 때 사절(死節)한 사람으로 근래 추증하고 정려(旌閭)한 사례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충청 병사(忠淸兵使) 증 병조 판서 성응길(成應吉)과 부사과(副司果) 증 승지 이위(李瑋)는 모두 왜란 때 순절한 사람들인데, 100여 년이 지난 뒤인 8, 9년 전에야 그 자손의 호소로 특별히 추증하고 정려하는 은전을 거행하였으니, 어찌 이들에 대해서만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과연 당시에 취사를 결정하였으므로 오늘날에 가볍게 의논할 수 없어 똑같이 추증하는 은전에 대해 끝내 윤허하지 않으신다면, 저 21인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혼백이 또한 황천에서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신이 마음에 격동하고 가슴에 측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유몽인(柳夢寅)이 지은 야담(野談) 1책(冊)을 훑어본 적이 있는데 ‘논개(論介)는 진주의 관기(官妓)이다. 만력(萬曆) 계사년(1593, 선조26)에 김천일이 거느리는 창의군(倡義軍)이 진주성을 거점으로 왜적과 항전하였는데 성이 함락되고 군대가 패하게 되자 백성이 다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자 논개는 곱게 단장하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채 촉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앞에 서 있었으니, 그 아래는 만 길 낭떠러지로 곧장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곳이었다. 왜군들이 논개를 보고 기뻐하였으나 모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는데, 한 왜장이 몸을 빼 곧장 앞으로 나왔다. 논개가 웃으면서 맞이하여 마침내 그 왜장을 껴안고 곧바로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저 관기는 음란한 창기인데도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왜적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 또한 성군(聖君)의 교화를 입은 존재로서 차마 나라를 배반하고 적을 따르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충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아, 슬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몽인은 문장으로 이름났는데, 이 이야기를 쓴 것이 자못 자세하여 신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며 탄식하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진주 병영에 도착하였을 때 촉석루 아래 남강 가에 과연 가파른 바위가 있었는데 ‘의암(義巖)’이라는 두 글자가 그 위에 크게 새겨져 있기에 신이 노인에게 물어보았더니 바로 논개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왜적을 죽인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하는 이야기가 자못 옛 기록과 다름이 없었으니, 신은 바위를 보고 이야기를 듣자 저도 모르게 의로운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 왜란 당시에 절개를 굽혀 자신을 판 자가 부지기수일 텐데, 어느 누가 일개 천한 기생이 사군자(士君子)도 어렵게 여기는 일을 능히 해내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에 설인고(薛仁杲)의 부하로서 당(唐)나라에 항복한 장수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배반하였을 때, 왕씨(王氏) 여인이 방선지가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방선지를 찔러 죽였으므로 조서를 내려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하여 그 의로운 행동을 정표하였습니다. 저 논개가 이루어 낸 것이 어찌 왕씨보다 못하겠습니까. 아, 야기(野記) 한 편에 꽃다운 이름이 뚜렷이 실려 있고 오래된 바위 한쪽에 ‘의(義)’ 자가 희미해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 자취가 묻혀 유독 그 아름다운 행적을 표창하지 않으니, 이는 미천한 신이 탄식하고 애석해할 뿐만 아니라 실로 남쪽 지방의 인사들이 모두 탄식하는 것입니다.
신처럼 어리석고 미천한 자가 지위가 낮고 말이 권위가 없어 과거에 두 번이나 아뢰었지만 모두 시행되지 않았으니 더 이상 번독하게 해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관장하는 직무가 극히 번잡하여 군대를 어루만지고 기민(饑民)을 구휼하는 방도에도 오히려 겨를이 없으니, 참으로 이런 일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고 직분에 관계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함부로 논열하는 까닭은 저 여러 신하와 한 기생이 의를 행한 뒤 원통함을 품게 되었는데도 호소하는 자손이 없어 끝내 성상께 알려지는 길이 끊어지는 것을 애처럽게 여겨서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이에 감히 염치를 무릅쓰고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미천한 사람의 말이라 하여 버리지 마시고 특별히 21명의 신하들에게 증직하는 은전을 균등하게 시행하고,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표창을 내려 억울한 넋을 위로하여 격려하고 북돋우는 방도로 삼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너무도 격렬하게 떨리는 간절한 마음을 견딜 길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당초에 구별한 것은 틀림없이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의암(義巖)이 남아 있다 하나 야담(野談)에 기록된 것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 100여 년 전의 일을 가볍게 거론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경이 충의(忠義)를 위해 장렬하게 희생한 사람들을 드러내 장려하고자 하는 뜻이 가상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